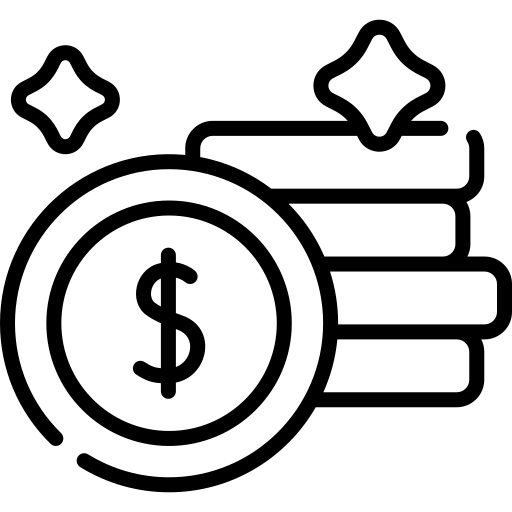국가경쟁력 비상 계엄 발언·인구절벽에 IMF 이상의 재앙

국가경쟁력 비상 계엄 발언·인구절벽에 IMF 이상의 재앙
국가경쟁력 비상 계엄 발언·인구절벽에 IMF 이상의 재앙
국정위 첫 도전장 정부 조직개편으로 기재부 금융위 검찰 구조조정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한 해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20위에서 올해 27위로 7단계 내려앉은 이유는, 주로 작년 말 발생한 비상계엄 이후의 정치적 혼란과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악화가 꼽힌다.
이는 민간과 공공 모두에 걸쳐 다양한 구조적 문제가 얽힌 결과로 보인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3년 세계 국가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 대상인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이는 해당 순위가 발표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하락폭으로, IMD는 매년 6월 이러한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게 하락한 분야는 정치적 불안정 부문이다.
관련 순위는 지난해 50위에서 금년에 60위로 내려갔다.
기업효율성 부문에서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작년 23위에서 올해 44위로 급락했다.
특히 대기업 경쟁력은 41위에서 57위로 떨어졌으며, 디지털 기술 활용 부문도 11위에서 26위로 하락했다.
한남대 김홍기 교수가 지적하듯,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강력한 규제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그는 규제 개혁 없이는 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통적으로 한국이 강점을 보였던 사회·기술 인프라 부문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이 부문 순위가 작년 11위였으나 올해는 21위로 추락했고, 도시관리와 유통 인프라의 효율성도 각각 4위와 3위에서 모두 28위로 크게 낮아졌다.
더 큰 문제는 디지털과 기술 인력 확보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이 부문에서 한국은 세계 최하위권인 59위를 기록했다.
첨단산업 인재를 해외에서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외국인 인력을 저질 일자리 중심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어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발생한 SK텔레콤과 예스24 해킹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도 한국의 순위는 세계적으로 저조하다.
관련 순위는 올해 40위를 기록하며 여전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청년 취업 문제 역시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청년실업 관련 순위는 작년 8위에서 올해 11위로 내려갔다.
반면, 고령층 취업만 늘고 대기업 공채 감소 현상이 지속되면서 '취업 포기자' 즉, 경제활동을 아예 중단한 청년층 수는 약 50만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노동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1달러로, 미국(83.6달러)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과 항목에서는 눈에 띄는 개선도 있었다.
한국은 이 부문에서 지난해 16위에서 올해 11위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이는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한 수출 실적과 안정화된 소비자물가 등 긍정적인 요인이 반영된 결과다.
IMD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 미·중 갈등 속 공급망 단절 위험 완화, 신기술 및 신산업 성장을 막는 규제 철폐,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다.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은 이와 관련한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가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국가경쟁력 회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가 경쟁력 정책협의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구조적 쇄신에 나설 계획이라 전했다.